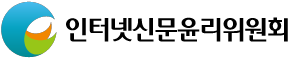3일 방송되는 KBS1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긴 세월 한결같은 뚝심 있는 맛,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정을 만나본다.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에는 ‘기름골목’이 있다. 10여 미터가 넘는 골목 양쪽에 온통 기름집만 들어선 곳. 어느 집에 들어가도 10년이 아니라 20년을 훌쩍 넘는 노포들 뿐. 하지만 그중에서도 손꼽을 만큼 오래된 곳이 있다. 이곳에 들어서면 눈에 ‘하트’를 띄우고 두 살 배기 손자에게 병에 기름 넣는 법을 가르치는 할아버지 장찬규(56) 씨와 그 곁을 지키며 만면에 미소를 띈 할머니 최연화(56)씨를 만나게 된다.
남편 장찬규 씨와는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어린 시절부터의 친구였지만, 그 친구와 결혼을 하고 가업을 이어 기름집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연화 씨. 이제는 장성해 가정을 꾸린 아들도 함께하며 ‘3대 기름집’이 돼서 든든하단다. 요즘은 기계가 다 해주는 세상이라 편할 것 같아보여도 참깨 건 들깨 건 겉으로 봐선 제대로 볶아졌는지 구분이 힘든데, 그 절묘한 타이밍을 맞추려면 대를 이어온 눈썰미가 필요하다.
참기름 들기름은 물론 동백, 고추씨, 홍화씨, 살구씨, 피마자기름까지 갖은 기름에, 미숫가루, 콩, 도토리, 메밀, 검정콩, 율무, 귀리, 감자, 고춧가루까지. 웬만한 가루는 죄다 만든다. 하루를 가득 채운 주문으로 바쁜 가게가 잠시 한산해질 무렵이면 그 때가 식사시간. 손님들이 앉던 조그마한 평상은 부엌이자 식탁으로 변신한다. 항상 달궈져있는 깨 볶는 솥에 들기름 바른 김을 몇 번 스치기만 하면 김구이가 되고. 직접 빻은 메밀가루는 생들기름으로 묵은지메밀전을 부친다. 장찬규 씨가 제일 좋아하는 고추지두부범벅엔 그가 어릴적 고추 농사를 지으신 부모님의 추억이 담겨있다. 4대가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최연화 씨 가족의 고소한 밥상을 만나본다.

대전군 구즉면은 직할시로 승격되고 광역시로 변경 되면서 지금의 대전시 유성구 봉산동이 됐다. 40여 년 전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기 힘들어 집집마다 궁여지책으로 만들기 시작한 도토리묵이 인근 관평동에도 퍼져나가 구즉 묵마을이 형성됐다는데.
우창희(58)씨의 어머니 전순자(79) 씨도 그 시절 가마솥에 묵을 쑤어 팔며 가족을 먹여 살렸단다. 어머니 손의 굳은살이 하도 단단해 종종 칼로 베어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창희 씨. 지금의 가게 자리는 온가족이 살아온 터전으로 아버지와 함께 흙벽돌을 직접 찍어내며 지은 집이란다. 특히 사랑채는 세살문까지 그대로 남아있고. 개조해서 가게로 쓰는 곳도 ‘계산하는 곳은 소 키우던 자리’, ‘손님용 별실은 벼농사 짓고 농사한 것 쌓아두던 방’ 하며 생생히 기억한다. 요즘에도 옛 생각에 아들 우시욱(26) 씨와 함께 집 뒷산을 올라 산짐승 먹을 것만 남겨두고 도토리를 줍곤 한다.
보통 도토리묵사발 하면 차가운 육수를 생각하지만 구즉 묵마을에서는 한여름에도 따뜻한 육수를 부어 완성한다. 그래야 묵의 식감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단다. 그런가하면 도토리묵은 채 썰어 볕에 말리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 두고두고 먹던 반찬거리였다는데. 우창희 씨의 동생 우숙희(53) 씨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만든 묵말랭이잡채와 도토리묵 가루로 부친 묵전까지. 창희 씨 가족의 묵 밥상을 맛본다.

‘순대’ 하면 흔히 먹는 일명 ‘비닐 순대’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본래 순대는 돼지 창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대창으로 순대를 만드는 일은 공장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재료를 조심히 다뤄도 구멍이 나기 십상이고 그때마다 실로 묶어야하기 때문이다.
얼마 뒤면 80세가 되는 한시동 씨는 요즘도 매일 새벽 돼지대창과 선지로 순대를 만든다. 그러나 절대 많이 만들지 않고 그날 팔 것만 만든다. 하루 지난 순대는 맛이 성에 차지 않기 때문이란다. 순대에 관해서라면 한 치의 양보가 없는 한시동 씨의 순대 인생은 50년 전 좌판으로 시작했다. 매부가 도축장에서 일했는데 돼지창자가 그냥 버려진다는 얘기를 듣고 얻어와 길에서 순대를 만들어 판 게 시작이었다.


박준희(51) 씨의 신발집은 한국전쟁 직후 노점에서 시작됐다. 그때는 고무신만 팔았지만, 지금은 17평 가게에 고무신, 운동화, 구두가 즐비하다. 하지만 어떤 손님이 뭘 찾더라도 취향과 필요에 꼭 맞는 신발을 척척 꺼내 주는 건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 3대 박준희 사장까지 이어지는 자랑이고 전통이란다.
그런데 먹고살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도 고무신을 파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었단다. 그 시절의 천연고무는 기워서 쓰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구멍 난 고무신을 가져오면 가게에서 기워주곤 했다. 새 것을 팔아도 모자랄 판에 버려야할 것을 기워주는 신발가게. 그것이 동양고무상회의 자부심이고 긍지란다. 준희 씨가 젊은 시절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살다가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그 마음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라는데.






![[종합] 숙행 '현역가왕3' 통편집 NO·1대1 승리…솔지·구수경 승리](https://img.etoday.co.kr/crop/84/63/2278015.jpg)


![[리더 인터뷰] '흑백요리사2' 이금희 셰프, '봉래헌'·'낙원' 총괄 조리장의 자부심 ②](https://img.etoday.co.kr/crop/142/107/227935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