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장덕의 죽음은 내가 연예기자 20년 동안 두고두고 마음속 깊이 남아 있다. 참으로 황망하고 안타까우면서도, 그의 아버지와의 색다른 만남은 마음에 진한 울림을 주었다.
장덕은 1980년대 흔치 않았던 여성 싱어송라이터로서 앞날이 창창했다. 하지만 늘 즐겁기보다는 슬퍼 보였던 것 같았고, 1990년 2월 함박눈이 내렸던 겨울, 29살의 나이로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장덕은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 ‘소녀와 가로등’, ‘꼬마 인형’ 등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만 136개고, 미발표곡까지 통산 200곡이 넘는 천재 뮤지션이어서 더욱 아쉬움을 더한다.
장덕은 오누이 가수 ‘현이와 덕이’로도 잘 알려졌는데, 오빠 장현도 설암으로 여동생이 죽던 같은 해 8월 짧은 생을 마감했다.
이들은 내가 햇병아리 가요기자시절 처음 만난 또래들이라, 자주 어울리며 친하게 지냈다. 장덕은 생전에 가끔 내가 “식사나 한번 하자”고 하면 “나는 누가 밖에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하면, 혹시 니네 집에 가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집밥 얻어먹으면 안 되냐고 거꾸로 물어봐요. 농담이 아니라, 집 밥이 제일 맛있어서 그랬어요”라고 대답해서 마음이 짠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다 보니 외식에 질려서, 엄마가 차려주는 ‘집밥’이 그립다는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를 꺼내고자 하는 것은 장덕의 죽음 다음날 빈소에서 그의 아버지를 만나, 겪었던 안타깝고도 기이한 취재와 인터뷰에 대한 기억이다.

1990년 2월 3일 나는 오전 마감을 마치고, 연예부 선후배들과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첫 밥숟갈을 막 뜨려 하는데, 내 허리춤에서 ‘삐삐’(무선 호출기)가 연신 울렸다. 회사 당직 선배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흥분된 목소리로 “홍성규 씨, 지금 연합통신에 ‘가수 장덕 자살’이라고 기사가 나오는데, 얼른 회사로 들어와서 추가로 기사 마감 처리 해야겠어”라고 했다.
“아니 대체 뭐 때문에 왜?”하는 생각에 방망이를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했다. 불과 며칠 전 만나서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생생한데, 도무지 믿기질 않았다. (장덕은 죽기 얼마 전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열렸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총회 현장에서 나와 우연히 만났었다. 평소 즐겨 입는 빨간색 외투에 베레모를 쓴 장덕이 나를 보고는 반가워했다. 그리고는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장덕은 자신이 써놓은 곡이 많은데, “가수들에게 좀 팔아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농담으로 “곡 팔아주면 맛있는 밥 사라”하고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런데 이때가 장덕을 마지막으로 만난 순간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나는 편집부 기자의 급한 호출로 신문사 편집국으로 뛰어들어가, 경찰서 발 연합통신 전송 기사를 보니, ‘가수 장덕이 마포 염리동 자택에서 자살했다. 고려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내렸다’는 사실 외에는 별다른 팩트가 없었다. 나는 일단 장덕이 ‘소녀와 가로등’, ‘님 떠난 후’등을 작곡하고 노래한 유명 가수라는 레퍼런스를 추가로 정리해서 편집 데스크에 넘겼다. 기사를 쓰는 손끝이 덜덜 떨렸다.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고 슬픈 감정은 일단 뒤로 접어두고, 기자로서 그다음 행동은 자살의 이유와 관계자들 반응, 빈소 취재가 필요했다. 주변을 수소문하니, 장덕의 시신은 서울 봉천동 친가로 옮겨졌다고 했다.
주소를 알아내, 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찾아갔다. 가까스로 찾은 상가는 앞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었고, 철 대문이 굳게 닫혀있었다. 사람이 죽었으면, 문상객들이 들락날락하고, 조등(弔燈)이라도 걸려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했는데, 아무도 없는 집처럼 조용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한참 후에 검게 그을린 피부에 마른 체구의 청년 하나가 걸어 나와서 “어디서 오셨느냐”고 했다. 나는 “신문기자”라고 신분을 밝히고, “빈소가 차려졌느냐. 들어가 봐도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이 장덕의 매니저라고 하고는 “병원에서 사망진단 내렸다고 알려졌는데, 오진이다. 장덕 아직 안 죽었다”면서 “명함 주고 돌아가면, 회사로 연락드리겠다”고 했다.
나는 이미 기사를 ‘자살’이라고 쓰고 나왔는데, 황당했다.
나는 ”장덕 씨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 들어가서 확인하겠다. 당신은 대체 누구냐. 오늘 얼굴 처음 보는데, 장덕 매니저는 맞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 매니저는 비로소 ‘김철한’이라고 인쇄된 기획사 명함을 주면서, 근처 가게 하나를 가리키며, 음료수라도 마시면서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했다. (나중에 이 김철한 씨는 오랜 기간 여러 유명 가수들의 매니저로 활동했고, 나와도 친분을 유지하다, 2017년 별세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나타난 매니저 김철한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전했다. “지금 전국의 도인들이 급거 모여와서 장덕을 살리려고 기도하고 있다. 밤새워 기를 불어넣으면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연예부장에게 이 사실을 전하니, “무슨 소리냐. 사망 진단 내린 병원에 다 알아봤다. 사실이 뒤집힐 리 없으니 그냥 회사로 복귀하라”고 했다.
밤늦게서야 매니저 김철한으로 연락이 와서는 “도사들이 노력했는데, 결국 소생하지 못했다. 내일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들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해왔다. 그러면서 “신문에 자살이라고 기사 났던데, 자살이 아니고, 약물 과다 복용이니 바로 잡아 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해왔다. 그러나 이미 발행된 신문이라 요즘 인터넷신문처럼 실시간 수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중에 사망원인에 대해 정확한 취재를 더 해서 기사를 다시 쓰겠다”고 했다.
②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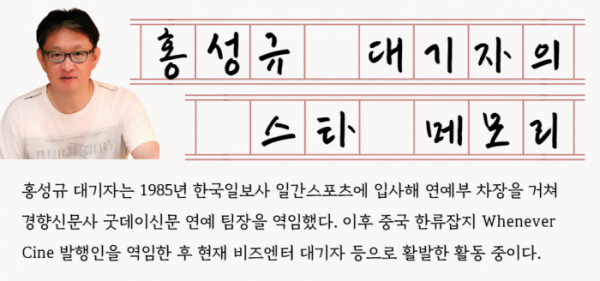





![[종합] '미스트롯4' 톱10 확정…허찬미·홍성윤·길려원·윤윤서·윤태화·염유리·유미·이소나·이엘리야·김산하 준결승 진출](https://img.etoday.co.kr/crop/84/63/2297445.jpg)

![[리뷰] '휴민트' 액션 맛은 일품, 스토리 맛은 익숙](https://img.etoday.co.kr/crop/142/107/2294344.jpg)
![[비즈 스타] '이 사랑 통역 되나요?' 고윤정, '얼굴 천재' 넘어 '믿보배'로(인터뷰)](https://img.etoday.co.kr/crop/142/107/2286004.jpg)
![[종합] '미스트롯4' 톱10 확정…허찬미·홍성윤·길려원·윤윤서·윤태화·염유리·유미·이소나·이엘리야·김산하 준결승 진출](https://img.etoday.co.kr/crop/85/65/2297445.jpg)













